
로그아웃하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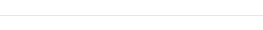
가 상 과 현 실 사 이
전시장은 황량했다. 분명 전시 중이라고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잘못 온 건가. "아무것도 없 잖 어 / 이건 뭐 완전히 속 았 잖 어" 장기하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텅 빈 전시장을 배회했다. 그러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2,3,4층의 모든 창문이 뜯겨 있었다. 뚫려진 창밖으로는 영등포 거리가 보였다. 창문 하나하나가 마치 바깥세상을 그대로 비춰주는, 유리가 제거된 액자 프레임 역할을 하는 듯이 보였다. 문득 일상적인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속한 세계에 대한 거리두기가 가능할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일었다. 아, 이거구나. 작가의 전시가 이거였구나.
보통 미술 전시장이라고 하면 창문 없이 폐쇄적인 하얀 입방체의 공간, 화이트큐브를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 안에 들어차 있는 작품이 상상된다. 그런데 오래된 상가 건물을 갤러리로 개조한 이 전시장의 특성상 창문이 뻥 뚫려있는 텅 빈 방을 하나씩 구경하자니 왠지 모를 시원함, 기분 좋은 황량함, 게다가 어떤 운치가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무슨 전시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라는 내 의문은 마지막 전시 공간, 1층에 몰래 숨어있는 영상 작업을 보고 술술 풀리게 되었다. 작가는 정확히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대해,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었다. 뜯어버린 창문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것을 논하기 전에, ‘현실과 가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자.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커먼센터'에서 열렸던 김희천의 개인전 <랠리>에 관한 글이다.
세계는 현실인가 가상인가
“이 세계는 현실인가, 아니면 가상인가?” 라는 의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제다. 동양의 장자는 간밤에 등 따신 장판 위에서 잠을 청하다가 문득 꿈을 꾸고는 다음 날 제자들을 향해 “내가 장판인지 장판이 난지 몰..”아니,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꾼 꿈이 현실인지 모르겠다며 비몽사몽했고, 또 서양의 플라톤은 동굴에서 낮잠 자다가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며 이 세계 역시 무언가에 의한 그림자일 뿐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 빠졌다. 시간이 흘러 21세기 한국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도 현피를 뜨는,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가장 흐릿흐릿한 나라가 되었다.
이 세계 전체가 가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이미 현실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오프라인 세계는 조그마한 액정의 온라인 가상 세계의 들러리로 전락한지 오래니까. 애인과의 카톡에서 하루종일 1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야심차게 올린 포스팅에 보팅이 단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자주 손바닥만 한 전자기기 앞에서 우울해지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액정 속의 세상을 ‘가상 세계’라고 인정하지 않고, 단지 이쪽 현실과 저쪽 현실을 매개해주는 ‘투명한 창문’으로 여긴다. 현실의 하위개념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는 단순히 오프라인의 인간관계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도구적 역할에서 멈추는가? 아니면 기존의 온-오프라인의 위계를 역전시키면서 인간에게 새로운 가상-현실을 만들고 있는가? 가상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린 동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진짜 현실이고 가상이란 말인가? 조그마한 분자들의 총합으로 구성된 물리적 현실 세계와, 역시 픽셀의 총합으로 구성된 가상 세계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게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가?


로그아웃해버린 창문
텅빈 전시장인줄 알았더니 작가는 자신의 영상 작품을 1층 껌껌한 어딘가에 숨겨두었다. 수수께끼를 푸는 심정으로 영상을 관람했다. 영상 초반에는 “모니터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며 가상으로 둘러싼 세계의 근본적인 회의를 나타낸다. 스마트폰 액정과 모니터는 가상 세계로 진입하는 대표적인 장치다. 그렇다면 좀 넓게 보아서 가상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이 도시의 '건축적 요소'는 뭘까? 김희천 작가는 고층 빌딩 전면과 사방을 장식하고 있는 유리 창문(파사드)을 주목한다. 유리 파사드는 건물 내부를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외부 세상을 그대로 반사하면서 담아낸다. 유리 파사드가 가리키는 진짜 세계는 어느 쪽일까?
우리나의 대표적인 고층 빌딩은 롯데2타워다. 작가는 롯데2타워를 둘러싼 음모론과 홀로그램 우주론을 접목시킨다. 무슨 말이냐고? 우리 세계 자체가 사실은 홀로그램이며, 사실 롯데2타워의 역할은 유리 파사드를 통해 우리 세계를 그대로 '백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상상을 펼친다. 오, 그럴싸한데? 왜 그 무리수를 둬서 기어코 지었는지.. 이제 알것만 같다. 롯데 2타워는 커다란 백업용 하드디스크였던 거이었던 거시다!
영화 <트루먼쇼>처럼 가상 세계를 조작하는 주체는 어디 있을까. ‘진짜’ 세계에 살고 있는 그들이 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하지만 김희천 작가는 이내 깨닫는다. 인간은 현실과 가상 어느 한 쪽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둘 사이를 매개하는 유리 파사드(혹은 액정, 혹은 모니터) 그 자체라고 말한다. 인간은 창문처럼 그냥 매개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냥 링크 그 자체다. 때문에 우리는 “조작하는 주체도, 바라보는 대상도 될 수 없는 병신”일 뿐이며, 인간은 영상 중반에 소개되는 홀로그램 우주론처럼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끊임없이 링크해야만 하는, 피곤하고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작가의 이런 해석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점점 가상세계로 진입하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을 자의식을 가진 주체라고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김희천 작가는 이를 전복시킨다. 인간은 이 우주를 백업하고 링크하는 매개채일 뿐이라는 것이다. 영상 말미에 “이제 그만 로그아웃하고 싶어” 라는 대사가 나온다. 작가가 건물 전체의 창문을 뜯어버린 의도를 곧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의 바람대로 창문은 두 세계를 매순간 연결하고 <랠리>해야하는 피곤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로그아웃에 성공한 것이다.
*2016년에 커먼센터에서 열린 마지막 전시, 김희천 개인전 '랠리'에 관한 글입니다.
*타이틀 디자인은 @kyun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