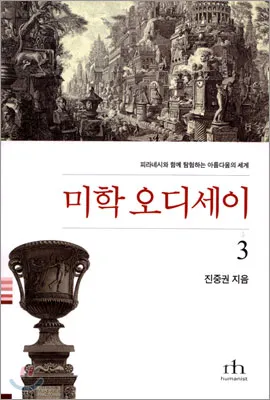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3>를 읽었다. 친구네 집에 갔다가 방바닥에서 뒹굴고 있던 이 책을 보고서는, 이 책이 3권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1,2권을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나 3권도 한 번 읽어야지 하다가, 도서관에 책을 빌려온지 2주만에 읽었다.
책을 읽고 난 소감은 1,2권이 더 좋다는건데, 그건 아마도 3권은 그림보다도 철학 자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거 같다. <미학 오디세이3>는 근대에서 탈근대, 현대로 넘어가는 작품과 사상을 다룬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샤피로와 하이데거 그리고 데리다를 비교하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예술의 진리를 '존재자의 재현'에서 찾은 샤피로와 달리 하이데거는 '존재의 개시'로서의 진리를 말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이다. 하지만 샤피로와 같이 작품의 최종적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근대의 한계에 머문다. 데리다는 이마저 해체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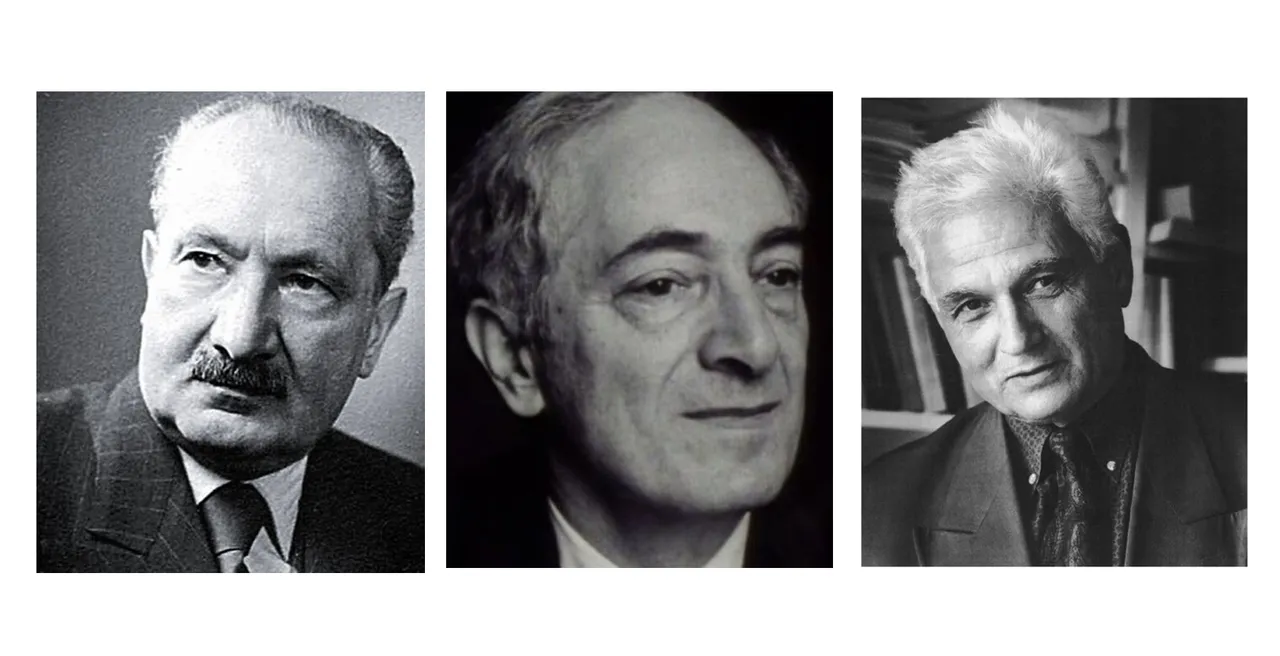
보통 유명 화가의 작품에는 최종적 해석이 있기 마련이다. 다양한 해석들 또한, 최종적 해석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서 다뤄지는 게 상식이라 여겨지기 마련이고. (위에서 인용한 문장은 고흐의 그림을 보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에 대한 데리다 자신의 해석은 어디에 있는가? 유감스럽지만 데리다는 에세이가 끝날 때까지 어떤 해석도 주지 않는다. (...)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능한 모든 해석을 암시한다. 가령 구두가 켤레가 아닐 가능성, 도플갱어일 가능성, 각자 다른 켤레에서 왔을 가능성 등등. 만약 작품에 '진리'란 게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의 해석 안에 남김없이 현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서로 조금씩 차이를 내며 무한히 전개되는 수많은 해석 속에 존재하는 듯, 부재하는 듯 그렇게 모습을 비치며 스쳐갈 뿐이다.
이 이야기는 작품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해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 저자가 얼핏 암시하듯 절대적인 무엇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라면, 무수한 해석들이야 말로 절대적이라 생각할 수 밖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실은 절대 없다는 절대적인 사실만이 있다는 말장난 같은 문장을 받아들이는 수 밖에.
결국,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은 삶을 해석하는 관점의 연장선에 있기 마련이라는 것.
그렇다면, '미로' 같은 해석의 갈림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더군다나 모든 해석도 출구에 이르지 못한다면? 작가는 로엔 슈타인의 소설 <어느 미로의 명문> 속 미로 벽에 쓰인 글귀를 인용한다.
하지만 미로 속에서 현명하게 길을 잃는 자,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발견하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