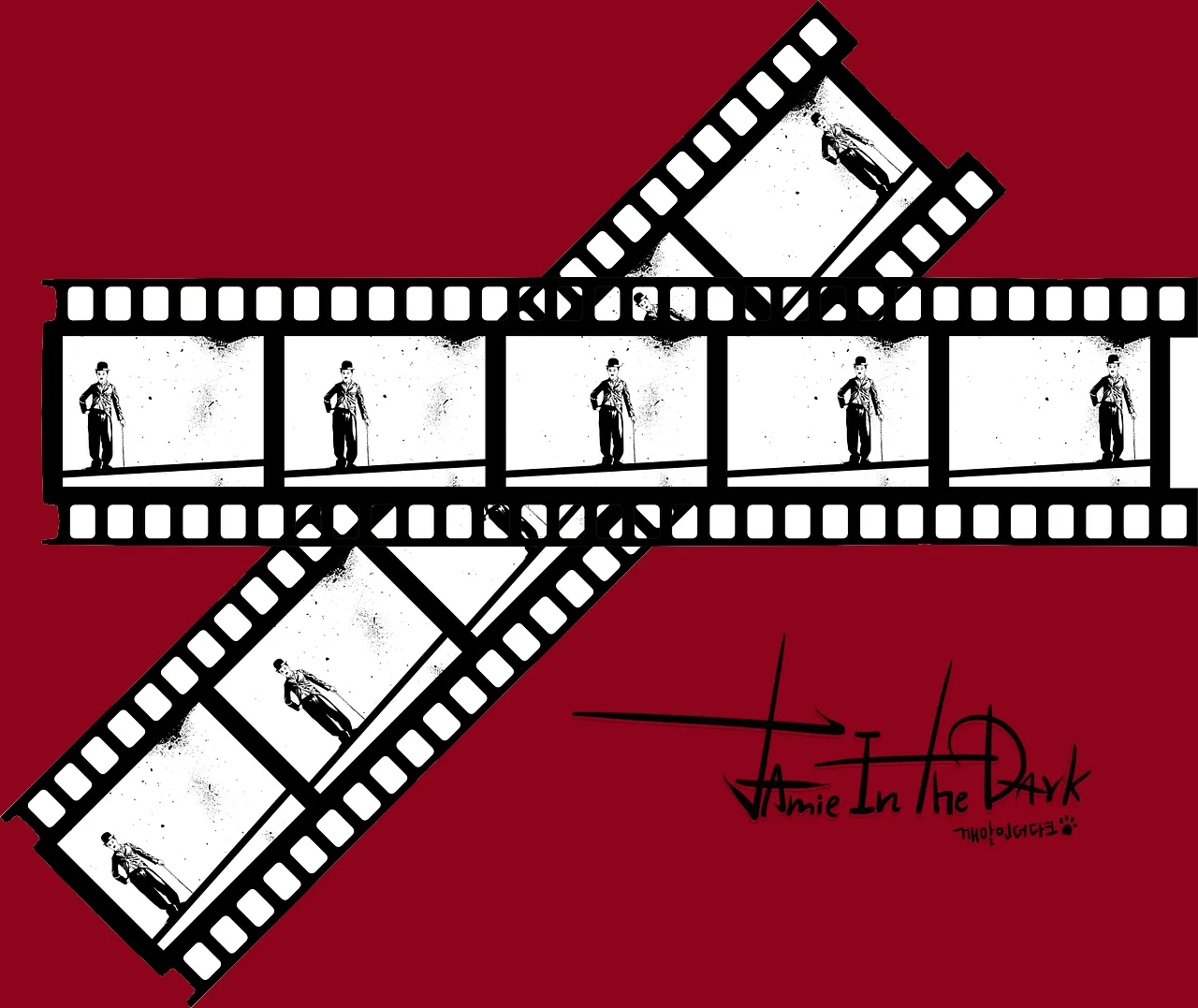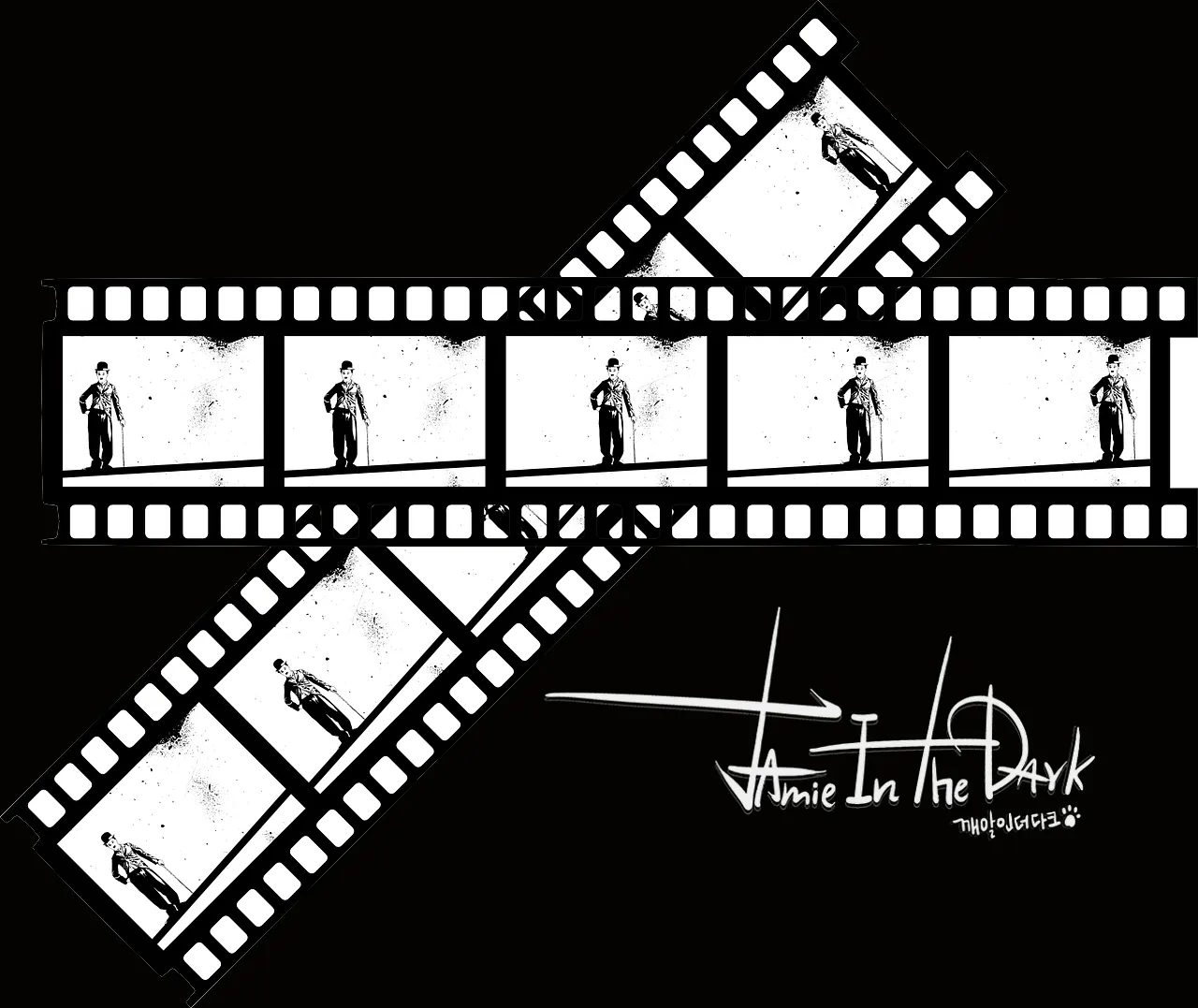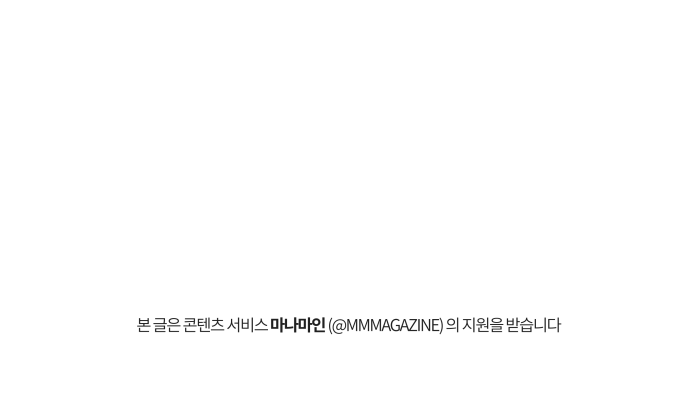1997년도에 개봉한 라이어(Liar)는 히치콕의 로프(The Rope)를 연상시킨다. 작은 공간에서 세 남자가 대화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에 각기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어는 '기만자'에 가까운 Deceiver라는 제목으로도 개봉되었는데, 전자가 특정한 상대를 상정하지 않고 (어쩌면 상습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뉘앙스라면, 후자는 특정한 목적과 상대를 두고 있는 속임수를 쓰는 자를 암시한다.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둘 다 나름대로 영화의 맥락과 잘 맞아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중심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고, 따라서 영화에서 등장하는 모든 거짓말은 1차적으로 이 기계에 내뱉는 것, 또는 기계를 속이는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럼 대체 살인자는 누구라는 거냐'는 질문을 품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사에 붙은 친구도 이해 못했다는 글이 버젓이 떠 있다.) 흥행에는 성공한 편이 아닌데, 세월이 지나 인터넷 상에서 이 영화의 해답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고.
내 입장에서 거친 과정은 대략 이랬다.
특히 모든 대사가 다 떡밥이었다는 것이 결론이다. 모든 것이 다 떡밥이어서, 속속들이 이해를 해야만 영화 전체가 이해가 되는 그런 케이스. 따라서 어설프게 이해한 상태에서는 "별 것도 아닌 내용을 꼬아놓았다"고 여겨지지만, 확실히 이해하고 나면 "너무 치밀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감상을 남기게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이 영화는 하나의 자세한 괴담처럼 여겨진다.
비현실적이라지만, 몰입도를 방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화 자체가 비현실적, 아니 몽환적인 작품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일단 거짓말 탐지기의 존재가 비현실적으로 부각된다. 결코 오류가 없음은 물론이고 도출된 결과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설정이다.
거기에다가 현실적이면서도 흔한 인물들이 더해진다. 일단 지능이 아주 높은 남자, 그런대로 높은 편인 남자, 그리고 낮은 편인 남자가 있다.


영화의 도입부부터 각 인물의 (IQ를 포함한) 프로필이 주어진다. 지능이 높은 남자는 팀 로스가 연기하는 웨일런드(Wayland)로, 한 에스코트 여성의 살인 용의자로서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고 있다. 웨일런드는 간질병 환자이자 재벌가의 아들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화를 보지 않고도 대략 어떤 종류의 컴플렉스에 휩싸인 인물인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영화는 그런 선입견을 자아내는 클리셰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 클리셰를 이용해서 다른 인물의 범죄 가능성을 적당히 잘 가린다.

마이클 루커는 지능이 그런대로 높은 편인 형사 윌 케너소를 연기한다. 세 남자 중에서 유일하게 멜로딕한 남부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인 존재감은 물론, 전체 대화의 전달력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상당히 머리가 좋다는 점은 이 인물의 낮은 출신과 아내에 대한 컴플렉스를 더 부각시킬 뿐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의심하기에는, 웨일런드의 거짓말들이 너무 확연하다.

마지막으로 크리스 펜이 연기하는, 지능이 낮은 브랙스턴이 있다. 웨일런드는 시종일관 그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브랙스턴은 천재야"라며 빈정댄다. 브랙스턴은 실제로 머리가 나쁜 인물이 맞지만,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는 웨일런드의 '천재'라는 말이 진심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세 남자의 '타입'에는 반전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 영화는 클리셰는 클리셰로 둔다.
살인 용의자 웨일런드와 에스코트 여성 사이의 관계도 그 자체로 상당히 클리셰에 가깝다. 긴장하면 간질병 증세가 나타나서, 사실상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웨일런드의 삶에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녀, 엘리저벳(르네 젤위거)인 것이다. 엄청난 클리셰이지 않은가?!

영화는 세 남자의 프로필과 긴장 관계에서 대부분의 관객이 가질만한 선입견들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그걸 뒤집는 '반전' 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놀라움을 제공한다. 인간 행동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알고보니 전혀 다른 캐릭터였다"는 식의 반전이 없이도 결과적으로 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엄청나게 부지런하다.
이는 고전 문학의 일부 작품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클리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끌고 가되, 거두고자 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클리셰 자체에만 눈을 두고 "뻔한데?"라고 외치는 독자/관객에게는 반전을 위한 반전이 걸맞을 수도 있겠다.)
사실 지나치게 촘촘하게 짜여진 대본, 즉 모든 대사가 다 실마리를 제공하는 식의 극은 작위적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한 번에 모든 실마리가 똑같은 난이도로 동시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 외에도 영화적 스타일링이 성공적이어서인지 자연스럽다. 현실적이 아닌 부분들까지도 다 포용하는 자연스러움이 있다. 하나의 작은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주인공의 회상 장면을 포함해서 자주 등장하는 버디 홀리(Buddy Holly)의 *Moondreams* 몽환적인 분위기에 더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말 멋진 노래의 발견이 되었다.아마 지금도 이 영화의 대사 하나하나의 '떡밥성'을 다 설명해둔 글은 찾아보기 힘들텐데, 아마 국내에서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1997년도 당시에 개봉하지도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조만간 시작할 영문 블로그에서 정리를 해볼 생각이 있다. 좋은 한글 대본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영화 라이어처럼 거의 모든 대사가 떡밥을 제공하면서도, 수많은 이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궁금증을 가졌다는 점은 이 영화가 지나치게 불친절하고, 전달에 실패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내 생각은 다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명료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누가 영화 하나 이해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 라이어 같은 영화는 엄밀히 말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해되는 작품에 비해 약간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정도다. (그것도 대중 영화 기준에서나 그렇다는 것이고, 작가주의 영화로 가면 '어렵다'는 것의 기준이 아에 차원이 달라진다.) 문학에 비교하자면 실마리를 엄청나게 던지지만 해답을 일찍 깨닫는 사람이 드문 추리 소설에 비견할 만하다.
문학이든 영화든 '어렵다'는 것을 무슨 약점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 없이 나열한 글/장면이 아닌 이상, 독자/관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라도 옹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정도로 잘 짜여진 작품이라면 더더욱.
아래는 '떡밥'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본 결과물로, (안) 읽어도 영화 포스팅과는 별 상관이 없다.
스토리 구성과 전달에 있어 '떡밥'이란 것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결말을 예고하기도, 전체 구조를 훤히 보여주거나 개연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떡밥'이란 쉽게 거론은 되지만, 창작자의 입장에서 솜씨 있게 소화하기는 어려운 그 무엇이다.
예전에 한 소설 지망생의 작품을 읽은 적이 있다. 작중 두 남녀의 대화로 거의 이끌어나가는 구조였는데, 초반부만 봐도 그 둘의 관심사가 니체와 정신분석학, 쇼스타코비치를 넘나들며 그림에도 관심이 많고 무용을 관람하고 왔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정확히 어떤 대화인지에 대한 묘사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 인물이 대강 '지적인'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남길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대화에서 어떤 스토리 자체를 조명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잠시 생각했다. 소위 '떡밥'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는 얘기다. 고작 그 정도의 막연한 캐릭터 스케치를 하기 위해 내용 없이 이름들만 등장하는 대화를 너절하게 늘어놓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다.
단편에 불과한 작품이었기에, 그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금새 알 수 있었다. 작가는 고작 바로 위에 언급한 '두 남녀는 지적이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알맹이 없이 그 둘의 대화 주제들을 나열했던 것이었다. 솜씨가 좋은 작가였다면 두어 마디 대사로도 충분했을 터였다. 미숙한 인물 스케치를 두고 혹여나 떡밥을 기대한 입장에서는 맥이 풀리는 효과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 모든 대사가 효과적인 인물 스케치, 또는 줄거리에 대한 떡밥을 제공해야 하는가? (물론 그 두 가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작가의 입장에서 캐릭터를 명확하게 잡고 있다면, 의도하지 않고도 모든 대사를 통해 인물 스케치가 조금씩 이루어질 것이다. 일명 '캐붕(캐릭터 붕괴)'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말이다. 또한 대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해서, 캐릭터들을 빌드업해야 할 것이다. 대사만을 갖고 캐릭터를 소개하면, 독자의 피로도가 올라갈 테니까.
반면에 어떤 작품에서든 떡밥은 제한되게 마련이다. 인물 스케치와 떡밥, 그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는 했지만, 결말을 포함해서 줄거리의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암시하는 떡밥들은 양적으로 제한이 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대사의 대부분은 떡밥보다는 캐릭터 스케치의 일환일 수 밖에 없다. 떡밥이라는 것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지나치게 친절한, '혹시 멍청이들을 위한 소설(혹은 영화)가 아닐까'란 생각을 들게 하는 효과만을 거둘 뿐이기 때문이다. 힌트가 지나치게 많은, 뻔한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작품들만 만들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떡밥은 적당하게, (이해력 및 호기심 측면에서) 평균적인 독자, 혹은 관객을 고려하여 몇 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할 정도의 궁금증만 남겨두고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정도로 주어지는데, 대부분 양적으로 제한되어 주어지게 된다. 위에서 말햇듯 실마리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 뻔해지고, 재미를 반감시키니까.
그런데 '적당한 양의 떡밥'이라는 이 공식을 무너뜨리는 작품들도 있다. 이들은 제법 풀 맛이 나는 수수께끼다. 결국, '떡밥'에 총량의 법칙 따위는 없다.